
상(象)과 수(數)의 개념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땅에서 살아 숨 쉬는 모든 것, 산 것이건 죽은 것이건 모두를 포함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우주의 끊임없는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우주의 목적은 생명활동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끝없는 생명을 이어주는 것, 즉 생명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주의 존재 목적성을 주관하는 운(運)과 우주 자체의 구성요소인 기(氣)들의 승부작용(승강부침昇降浮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행하는 끊임없는 운동을 통해 변화하며,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우주는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를 통해 인간을 알고 생명의 신비를 밝히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주의 변화는 먼 나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또한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것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감각적인 일, 즉 사람(人)과 일(事)와 물(物)의 상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그 다음으로 사람과 일, 사람과 물질, 사람과 일과 물질이 관련된 것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삶은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이며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주의 변화란 공상과학 영화 속의 공상•상상•망상에 불과 할 뿐이며 인간이 향유해야 할 실학적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동양철학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사람중심의 실용적인 학문을 하기 위하여 모든 철학적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우주의 운동은 운(運)과 기(氣)의 운행법칙이다”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그 운(運)과 기(氣)를 실제 배워 익혀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운(運)은 흔히 ‘행운(Good Luck, Good Fottune)’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운(運)은 천문학에서 말하는 천체의 궤도운동이나, 행성운동법칙에 가깝다. 더 상세히 말하자면 천체에 속한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행성운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상호작용 자체를 말하며, 그 천체궤도운동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운(運)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천체 궤도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 인간들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운동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이 ‘상(象)’과 ‘수(數)’이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눈으로는 그 변화를 느끼거나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체계를 갖춘 이론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안되었던 것이다.
따로 살펴 볼 터이지만 우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노트에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안된 개념이 무극과 태극이다. 무극은 실제 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알 수 없는 현실 속의 우주를 말한다. 이와 같은 무극의 세계를 우리가 가정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기호나 부호로 대신하여 만들어 낸 개념이 태극인 것이다. 이를 도가에서는 ‘一’ 한 일을 긋고 태극이라 한 것이다. 또한 똑 같은 이치로 불교에서는 ‘’ 원을 그리고 ‘원융(圓融)’이라 한 것이다. 철학적 개념이란 말이나 글로는 정확히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차용하여 정의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사랑(愛)이나 행복(幸福)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 자리 잡고 또한 사람마다 다 그 크기나 정도가 다른 것인데, 타인에게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사랑(愛)이나 행복(幸福)이라는 언어로 대신 전하는 것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의 변화(천체의 궤도운동작용)를 ‘운(運)’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는 우주의 운동과 변화 속에서 나타내어지게 되는 모든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흔히 이런 개념을 차용하여 운명학(명리학)이 파생되었다.

우주의 운동과 변화 속에 우주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자체의 본원인 기(氣-자신, 사람)라는 존재가 시시각각 변하는 우주 환경 속에서 어떠한 형태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나(我) 사이의 상호간에 형성되는 관계를 정확한 인식을 통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인위(人爲) 또는 작위(作爲)에 의해서 철학적 개념이 정의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상(象)과 수(數)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먼저 상(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말하는 상(象)은 한자어로 코끼리 상(象)자를 사용하는데, 과연 코끼리를 통하여 우주의 변화에 대한 배움의 단초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쯤은 들었을 법한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속담이 있다. 이 이야기는 불교와 함께 외부로부터 전래되었는데, 먼 옛날에 인도의 어떤 왕이 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하였다.
"그대는 코끼리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소경(맹인, 장님)들에게 보이시오."
대신은 왕의 명령을 받고 여러 맹인들을 불러 코끼리를 보였더니 소경들은 제각기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았다. 대신이 돌아가 왕에게 아뢰었다. "소신이 코끼리를 보였습니다."
왕이 여러 소경들을 불러 묻기를, "너희는 코끼리를 보았느냐"하였다.
맹인들이 제각기 코끼리를 보았다고 대답하자 왕은 코끼리가 무엇과 같으냐고 다시 물었다. 상아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무와 같이 생긴 동물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귀를 만져본 맹인은,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와 같이 생겼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코끼리 머리를 만진 장님이 나서서 크게 말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돌과 같습니다." 하였다. 이어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절굿공이 같다고 말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나무통 같다고 말하고, 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평상 같다고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항아리 같다고 말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동아줄 같다고 하였다.
이는 불경 '대반열반경'(大般涅盤經) 32장에 나오는 우화로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성어의 배경이 되었다.
'열반경(涅盤經)'을 좀 더 살펴보자면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야, 저 맹인들은 코끼리의 전체 모양을 말하지 못하였으나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일 그 여러 모양이 모두 코끼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떠나서는 따로 코끼리가 없다. 선남자야, 임금은 여래ㆍ정변지에 비유되고 대신은 방등의 대열반경에 비유하였고, 코끼리는 불성에 비유하고 소경들은 모두 무명중생에게 비유하였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색이 불성이라고 말하였다. "
이와 같은 이야기는 송나라(宋) 석도원(釋道原)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24 홍진선사(洪進禪師)편에 도 출전하는데, "스님이 묻기는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홀연 눈이 밝은 이를 만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有僧問, 衆盲摸象各說異端. 忽遇明眼人又作마生)라는 고사가 있다. 이에 중맹모상(衆盲摸象), 군맹모상(群盲摸象),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 하며 우리 속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뜻이다.
이 우화에서 전하고자 한 교훈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말이다.
반드시 이 우화를 모티브로 해서 상(象)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지만 위 우화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사람은 자신이 익히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누구라도 없을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일이 그렇듯 감각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닌 한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지 않으려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당연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 모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상(象)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주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변화는 너무도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우주의 범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초자연적이라고도 하며 초감각적이라고도 한다. 분명히 우주는 변화하고 그 어떤 현상이 실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에서 상(象)의 개념을 설정하여 우주를 이해하려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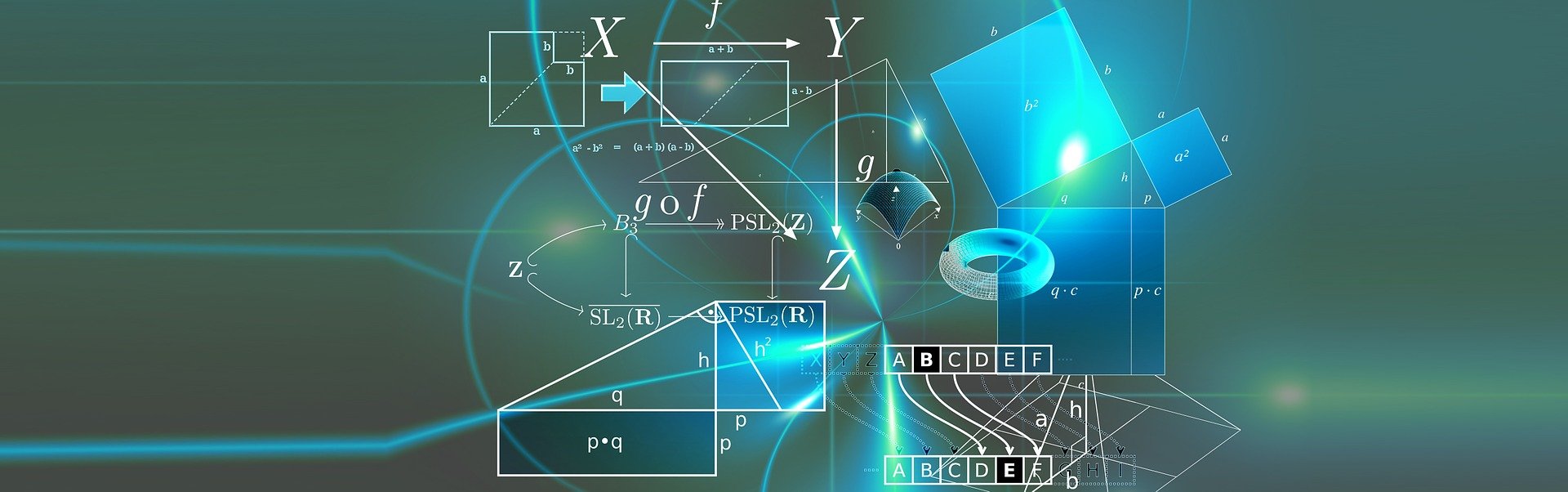
사람마다 지식이나 경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성인들과 현인들은 이해하지만 일반 범부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과 현상들을 포함한 우주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의 개념을 ‘상(象)’이라 하며, 그중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상(像)이라고 하며 또 다르게는 모습을 지녔다고 해서 ‘형(形)’이라 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 형체가 있는 유형을 일반적인 형(形)이라 할 것 같으면 형체가 없는 무형을 상(象)이라고 구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동양철학의 체계에서는 무극이나 태극, 음양, 오행의 개념을 상(象) 개념의 범주에 설정하는 것이다. 무극을 이야기하고 태극을 설명하고 음양오행에 대하여 갖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인식하거나 감각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이해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철학이론이 정립되기 전 초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주의 운동과 변화를 상(象)으로 개념화 하였지만 이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지닌 개념이기 때문에 상(象)에 대한 대(對)한 개념으로 수(數)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상(象)으로는 우주이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없으니 이를 대신한 임의의 기호, 부호 등의 정보체계나 문자들로 체계화 한 개념을 ‘수(數)’로 대신 나타내어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무극, 태극, 음양, 오행이 우주이 변화를 구분하여 나타낸 상(象)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상(象)에 대비하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체계개념이 수( 數)라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수(數)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 수(數)란 일반적으로 카운트(COUNT)의 의미로 숫자를 세고, 셈을 하는 수(數)의 기능에 익숙 되어져 있어서 쉽게 이 수(數)의 개념에 관한 틀을 벗어나기가 힘든데, 수(數)는 본디 ‘헤아리다’라는 말의 뜻이 강하다. ‘헤아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떠한 사실이나 일에 대하여 미루어 짐작하여 인식한다는 예측의 뜻이 산수의 수(數)보다 강하다. 또한 수(數)에는 주요한 기능이 담겨져 있어서 ‘그 무엇을 대신한다’는 대수(代數)의 뜻이나, 임의의 정의 된 수(數)의 개념을 함수(函數)의 뜻도 담겨져 있다. 서양의 수(數)에 대한 개념은 산수나 수학, 구분의 표식(달력)에 치중한 반면, 동양에서는 어떤 일이나 현상을 미루어 짐작하는 헤아림과 다른 것에 대한 대신하거나 임의로 정의 지워진 대수와 함수의 뜻이 강하게 작용하고, 서양의 것들처럼 산수, 수학, 달력 등의 역법이나 역산에 두루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양오행이 상(象)의 개념이라 한다면 천간지지는 그 상(象)에 대한 수(數)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다.
천간(天干)의 예를 들면,

역학(易學) 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표는 눈 감고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갑(甲)이라고 하면 음양 중에서 양(陽)의 상(象)에 대한 개념과 오행에서 목(木)에 대한 상(象)의 개념을 동시에 함장한 공통의 개념으로 상정한 수(數)의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은 상(象)의 개념이고 십천간은 수(數)의 개념임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첫 번째 천간인 갑(甲)은 양(陽)의 성정과 목(木)의 성정을 동시에 지닌 존재인 것이다. 단순히 구분을 위해 설정한 것에서 벗어나 위 도표가 주는 정보의 체계를 분명히 구분하여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본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 중 ‘음양에 대한 개념’과 ‘오행에 대한 개념’ 그리고 ‘천간에 대한 개념’을 각각 참고해 읽어보시고 보시길 바란다. 각설하고, 상(象)은 기(氣)의 발생 또는 분화직전까지의 정미(精微, 정밀하고 미세함)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수(數)의 개념은 기(氣) 상태에서 형(形)과 질(質)로 조직되어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감각이나 인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상(象)과 수(數)의 개념은 사람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우주의 개념을 사람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개념으로 설정하여 배워 익혀 실용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에서 비롯된 고대 동양인들의 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象)과 수(數)의 개념에 관한 학문을 줄여서 ‘상수학(象數學)’이라고 하는 바 상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동양의 학문은 물론이요, 서양의 학문 특히 수학에 대한 이해도를 엄청 증진 시킬 수가 있다.
'동양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氣)의 본성 (0) | 2022.08.02 |
|---|---|
| 기(氣)의 개념 (0) | 2022.08.02 |
| 수승하강[水升下降]의 원리 (0) | 2022.08.02 |
| 사람은 태양을 먹고 산다 (0) | 2022.08.02 |
| 동 · 서양 사유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 (0) | 2022.08.01 |



